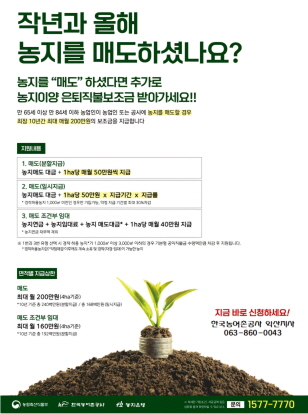윤석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지 않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이 정치적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 지금, 법복을 벗고 정치로 향한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번 칼럼 시리즈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사법정신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양심의 좌표’를 되짚는다. 권력의 언어가 정의의 언어를 덮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편집자주]
검찰은 법의 최전선에 선 조직이다.
불법을 밝히고, 부패를 단죄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공익을 지켜야 하는 존재.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의의 대변자’가 아닌 ‘정치의 플레이어’로 불린다.
법의 언어는 사라지고, 정치의 언어가 검찰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을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검사’의 연장선으로 본다.
법을 무기 삼아 상대를 제압하고, 수사권의 권위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바꾸는 순간, 그들은 이미 검찰의 본령을 배반한 것이다.
법의 본질은 공정함과 절제다.
검찰 출신 정치인일수록 더욱 냉정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정의의 칼을 쥐었던 손이 이제는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면,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된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권력보다 양심을 택했다.
그는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기며 사법 독립의 기둥을 세웠다.
그 정신은 지금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가장 먼저 되새겨져야 할 말이다.
법으로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자신부터 법 앞에 서야 한다.
검찰 출신 정치인의 덕목은 단순한 법 해석 능력이 아니다.
그들의 진짜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국가 시스템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치의 권력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정치의 무대에서 법을 팔지 말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의 품격을 세우라.
그것이 검찰 출신 정치인이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자격이다.
“그대들은 지금, 법을 지키는가, 아니면 법을 이용하고 있는가.”
김병로 정신의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