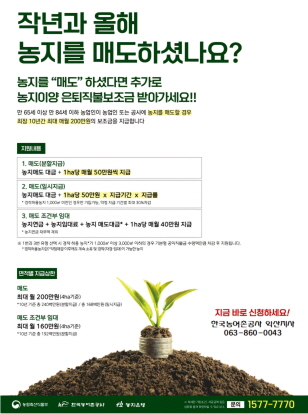요즘 단체대화방을 장식하는 단골 소재가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의 과거 발언과 경력을 꺼내 “국가 재정도 다뤘던 사람이니 지역 예산도 잘 챙길 것”이라는 식의 기대를 부추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이 경계해야 할 것은 그 홍보가 은근히 깔고 있는 구조, 바로 기재부 카르텔식 프레임이다.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서로를 띄우고, 서로를 보증하며, 출신이 곧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폐쇄적 논리다.
정책과 성과가 아닌, 학연·경력·라인이 정당성을 대체하는 순간, 공공의 영역은 무너진다.
더 큰 문제는 그 프레임이 시민에게 아주 위험한 착각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기재부 출신이 일을 하면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은 달콤하지만, 민주주의에겐 독이다.
예산은 ‘가져오는 돈’이 아니라, 국가의 기준과 절차 속에서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공공 재원’이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을 앞세워 예산을 마치 개인의 능력, 더 노골적으로는 개인의 ‘라인’으로 가져오는 전리품처럼 말하는 순간, 그 지역은 발전이 아니라 예산 중독에 빠진다.
더구나 그런 포장은 늘 이쯤에서 결론으로 흐른다.
“우리가 남원 예산을 살릴 사람이다.”
그러나 시민은 이제 묻는다. 그렇다면 공직의 꽃피는 시절, 정말 남원을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
고향이 남원이라면, 기억에 남을 만한 굵직한 성과 하나쯤은 남아야 한다.
그것이 ‘타이틀’ ‘근거’다. 공직 경력은 명함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례가 있다. 이웃 순창 이야기다.
순창과 전주를 잇는 국도가 직선화되기까지의 과정엔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전해진다.
당시 익산지방관리청장이 순창 출신이었고, 낙후된 구간 비탈길과 오르막을 고가육교와 새로운 공법으로 개선해 지금의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
그 결과 순창 군민들은 실제로 체감할 혜택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출신 자랑’이 아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흔적이다. 멋지지 않은가. 지역민이 기억하는 것은 “누가 어디 출신인가”가 아닌, “무엇이 바뀌었는가”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정작 공직의 한복판에서는 남원에 뚜렷한 변화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남원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처럼 포장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과를 쌓아서 남원으로 오는 것이 아닌, 남원을 발판 삼아 다시 무대에 서려는 형국으로 보이기 쉽다. 시민이 불편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기재부 출신 김동연 경기지사의 지지 발언까지 더해지면 오해는 더 커진다.
김 지사 역시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이냐 낙선이냐를 고민해야 할 정치인이다.
그런 인물이 내민 지지 선언은 ‘공공적 평가’라기보다 ‘정치적 연대’에 가깝다. 남원시민은 그 지지를 “검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기재부 출신이 같은 기재부 출신을 띄우는 장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감이 아니라 기재부 출신끼리 서로 보증을 서는 내부 순환 구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남원은 더 이상 “예산 따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다.
남원이 필요한 것은 관료의 언어로 포장된 신화가 아닌, 시민의 언어로 증명된 변화다.
기재부 카르텔은 화려한 경력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만, 시민은 이제 묻는다.
남원이 당신에게 필요했는가, 아니면 당신이 남원에게 필요했는가.
정치는 출신으로 보호받는 순간 썩는다.
남원시민은 이제 그 낡은 공식을 끊어낼 때다.